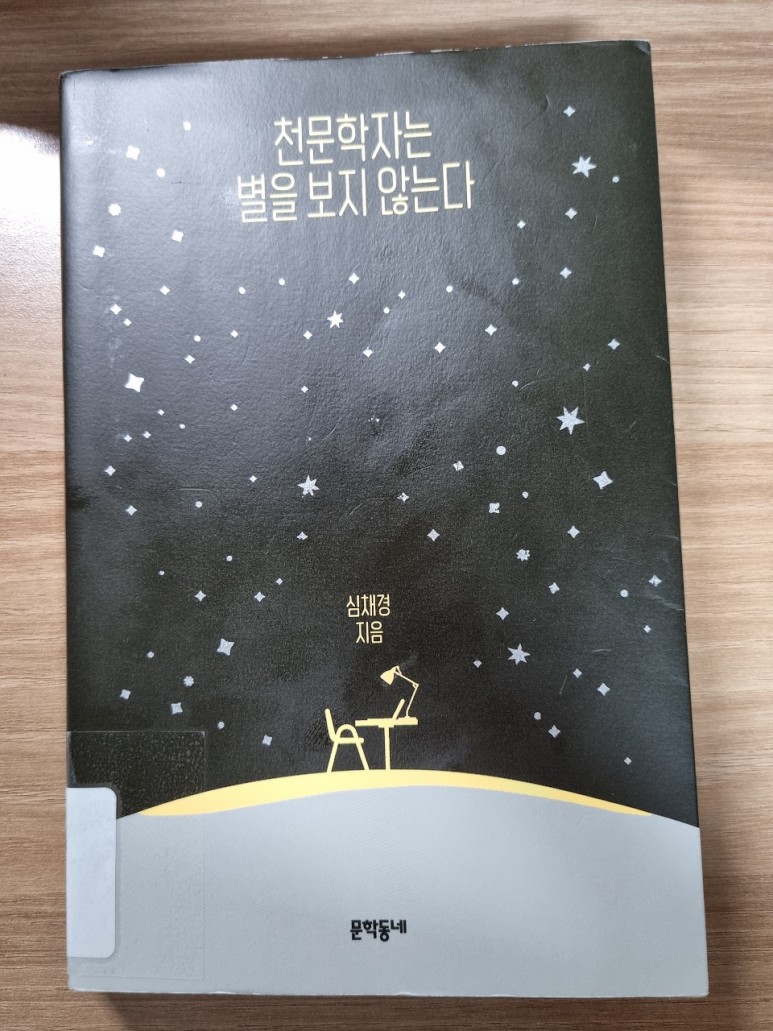고등학교 때 내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예상외로 물리학이었어 수학에 자신이 없던 내가 물리학을 가장 재미있게 한 이유는 물리학을 이해해야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될 것 같은 이상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다른 과목에 비해 주요 공식만 익히면 크게 기억되는 것이 많지 않은 과목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물리학이기도 했지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몇몇 공식은 왜 이렇게 도출됐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인지 다시 한 번 정말 똑똑한 사람만 하는 과목이라는 인상을 굳혔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과학은 단지 담임선생님이 지구과학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과목이었다. 물론 별자리나 달, 태양계, 은하계 등을 배우는 것은 즐거웠지만 내가 가지도 못하는 행성의 특징을 기억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다. 차라리 지구에 대해 배우는 게 더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 이 책은 내가 직접 도와주기 어려운 책이었다. 즐겨 보는 유튜브 채널 겨울서점에서 이 책을 추천했던 기억이 났다. 나는 도서관에서 이 책을 우연히 신착 도서로 발견했고, 그저 추천한 책이라 낯익다는 이유로 구하게 됐다.
몇 장 안 읽었는데 솔직히 진짜 웃겨서 3일 만에 다 읽었어 천문학은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다지 낭만적이지 않은 학문이었지만 대한민국의 소수 정예 천문학자이자 행성학자로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이 매우 새롭게 느껴졌다.
나는 이공계가 아니라 철저한 문과생이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도 아름다운 지구를 볼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달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꿋꿋이 태양계를 돌고 있는 명왕성, 그리고 그의 주위를 도는 위성 이야기 등이 감정적으로 다가왔다.
이 책이 좋았던 것은 천문학에서 이런 중요한 점이 있으니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고 강요하지 않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저 담담하게 나는 천문학자이고 천문학자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삶을 살았으며 천문학자의 관점에서 어린왕자 이야기와 한 소설의 달 이야기, 고대 천문기록 등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읽는 것이 재미있었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로서 학생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며 교수의 본분이 무엇이고 대학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는 점이 좋았다.
또 하나, 이 책의 저자가 한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막대한 업적이 있으며, 그런 점이 강조되는 편이 아니라 대학교수로 천문학에 우연히 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강조된 것도 좋았다. 박탈감이 느껴지기보다는 친근감이 더 느껴지는 읽을거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학이 고등학교 연장선이나 취업준비소여야 한다. 대학이 학문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공부라는 것을 좀 더 깊이 해보고 싶은 사람, 배움의 기쁨과 고통을 젊은이 한 조각과 기꺼이 맞바꿀 의향이 있는 사람만 대학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며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자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경제적 부를 축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56p칼론도 자신을 뭐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명왕성, 그리고 자신보다 작은 여러 위성 친구들과 서로 중력을 주고받으며 오랫동안 멈추지 않는 자신들의 왈츠를 추고 있을 뿐이다.245p 우주경쟁시대 초반에는 소련이 항상 미국보다 한 발 앞섰는데 아폴로 우주인의 달 착륙으로 상황이 역전됐을 때 그때도 달 과학자였던 그는 어떤 기분이었느냐는 질문이었다. ~ ‘우리’가 사람을 달에 보내서 기뻤다고 하는 거야 우리는 미국인도, 미 항공우주국 관계자도 아닌 인류 전체였다.~과학논문은 항상 저자를 「우리」라고 칭한다.~연구는 내가 이류의 대리자로서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논문으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논문 속의 ‘우리’는 논문의 공저자가 아니라 인류다.265p 이 책을 계기로 아주 조금 천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어 나중에 신문 기사에서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에 관한 기사를 보거나 새로운 별을 발견했다는 기사를 읽거나 한국에서 우주로 향하는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쳤다는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전보다 더 관심을 갖고 기사를 읽게 될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면서 왠지 들어야 할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